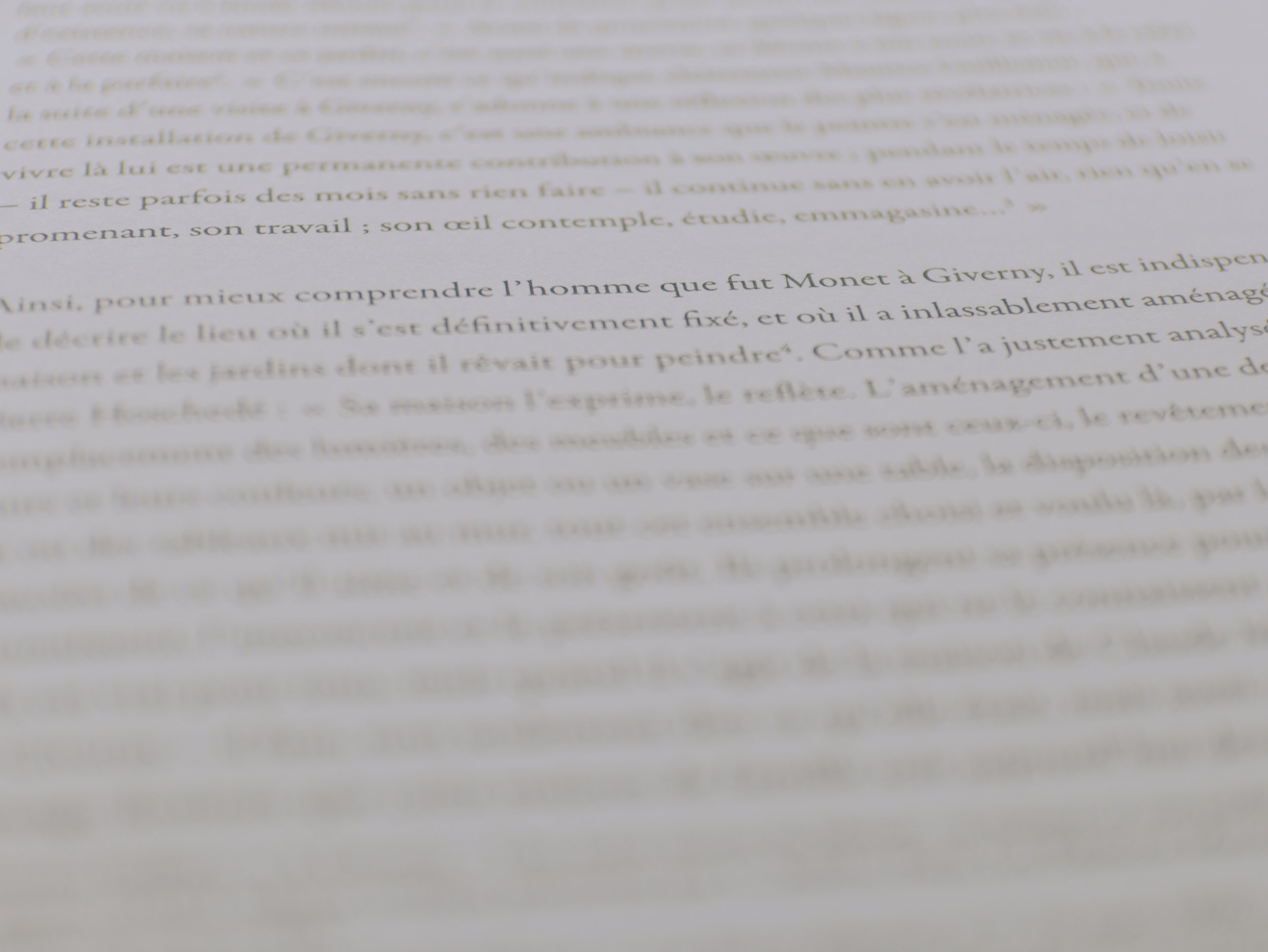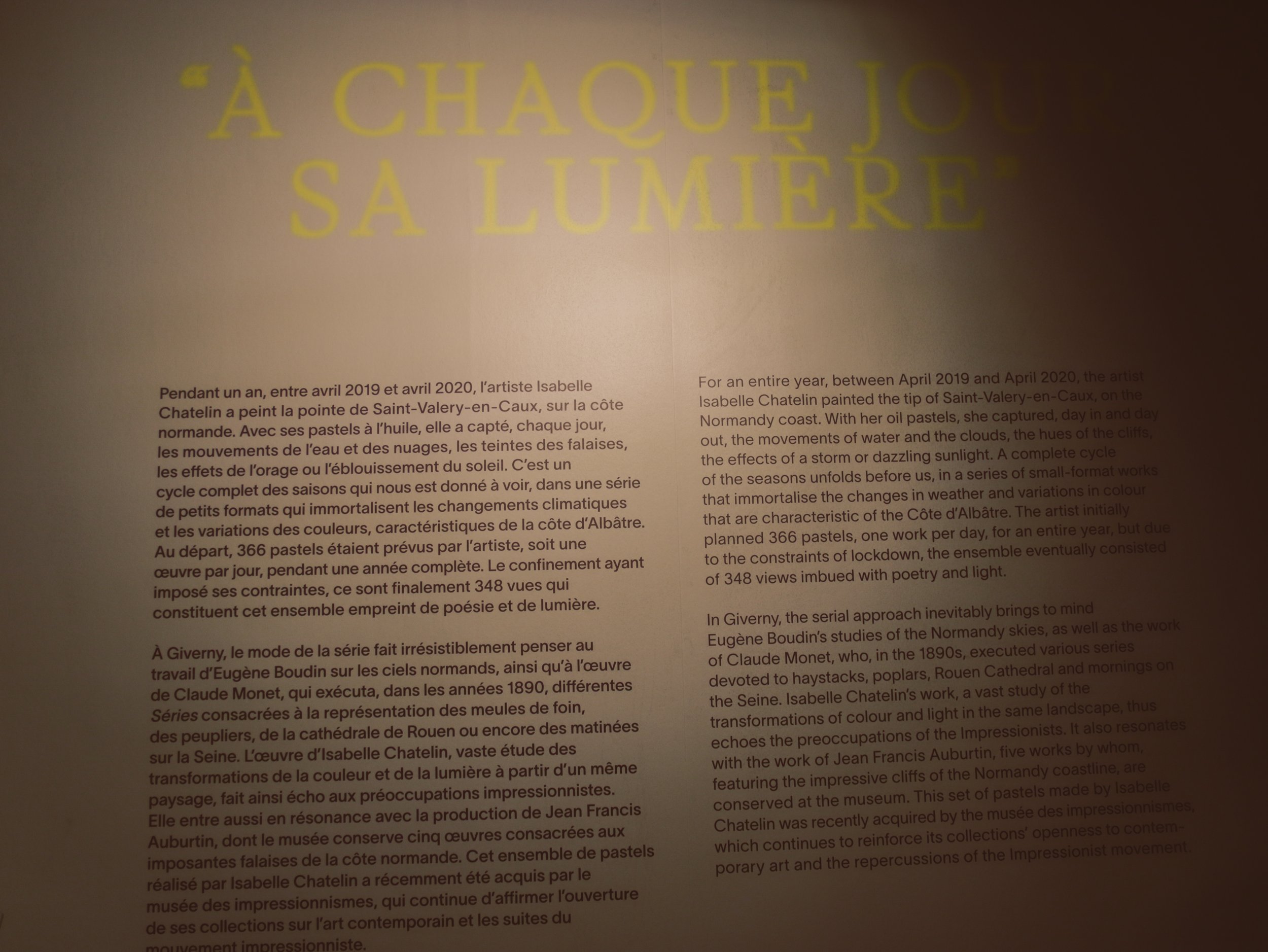Giverny, France
S가 떠나고 나는 먼 길을 향해 떠났다. 파리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석이 아니면 타지 못해 계획했던 기차를 눈앞에서 떠나보냈다.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한시간 동안이나마 현수가 함께 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이제 혈혈단신이라는걸 깨달았는지 그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파리로 가는 다음 기차는 길에 문제가 있어서 30분 가량 늦게 도착했고, 사라자 역으로 이동 후 베르논 기차를 타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영어를 쓰는 암스테르담과 달리 파리역에 적힌 전광판 스타일과 영어가 거의 없는 표지판에 난감했다. 그나마 한번도 아니라 두번이나 날 똑같이 도와준 친절한 청년 덕에 기차를 탔다. 베르논에 내리자 나는 아차 했다, 실외 역이었다. 밤 10시 였지만 동네는 한밤중인것 같이 조용했다. 마땅한 역 건물이 없다는건 그만큼 외곽이라는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버가 다닐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정말 기적적으로 우버를 잡을수 있었다. 흥이 넘치는 젊은 오빠인듯한 운전자 덕에 덜 겁먹고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화장도 양치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고꾸라졌다. 졸려서가 아니라 속이 체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서있을수가 없었다. 새벽 내내 호야와 전화를 붙들며 간신히 버티고 잠이 들었다. S가 떠나기 전 내가 너 없이 잘 갈 수 있을까, 를 하루 종일 반복하던 내가 생각이 났다. 언어도 안되고, 와이파이도 잘 안터지는, 외딴 땅에서 혼자 나머지 2주를 지낸다는 생각에 내향성이 극도로 치닫아 결국 몸이 긴장해서 소화기관도 멈추고 시야도 흐릿해져 어지러웠던것 같다. 런던에 살면서 혼자 살기는 해봤어도 긴 시간 내내 장소와 나라를 옮겨다니는 혼자 여행은 어쩌면 처음인지도 모르겠다. 작은 케리어 하나에 모든 삶을 담고 카메라 하나로 내가 걷는 모든 세상을 담는 여정. 그 첫 여정에 나는 겁도 먹고 또 두렵기도 해서 그렇게 힘들게 첫 밤을 보냈다.
In the morning host madam left a breakfast basket in front of the cottage. I was alive from the long night before, and the basket seems to be a greeting for my new fresh day. The breakfast was an assamble of such fresh food with no seasoning or second cooking. The croissant was so buttery and fresh, and the cheese was salty enough to match the half-boiled egg. How could I describe it, a clean, healthy, eco-friendly food? The cheese was probably one of the best ones I've ever had.
숙소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오래되었었다. 허름하기 보다는, 모든 건물 자체가 세월을 단단히 먹고 굳게 서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빈방이 없어 받은 용돈을 쓸어 모아 독채를 빌렸는데, 하얀 벽에 하얀 커텐, 나무와 회색으로 이루어진 가구, 금색 전등의 실내가 소박하고 깔끔했다. 그 어느 창문을 열어도 나무가 가득했다. 어디를 열어도 나를 반겨주는건 나무의 바람이고 새의 노래였다. 시원했다. 첫날은 그렇게 창문을 가득 열어두고 옆방 침대에서 낮잠을 실컷 잤다. 일어나니 햇살이 하얀 커텐에 나무가지를 비춰 그림을 만들어냈다. 독채집이 작은 편이 아니었지만 밖에서 보면 모든 창문 틈으로 독채의 다른 끝이 보일 만큼 넓고 공간이 탁 트여있었다.
스콧은 나를 볼 때마다 조용히 와서 내 손길을 받았다. 큰 정원을 거니며 모든 게스트에게 인사하는 스콧은 참 행복한 개라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딱 봐도 산타클로스 같이 생기신 주인 아저씨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소피같으신 아주머니에게 스콧은 9개월된 아이와 다름없어 보였다. 아주머니는 그래서 스콧이 에너지가 넘쳐나서 참 좋다고 하셨다.
During my shoot of my dailylook the camera dropped off from the tripod and the LCD screen stopped. But the camera itself was alive... I was shocked for the night but decided to be happy and thankful that the camera is working, not dead. Because I was right about to come to the pinnacle of the trip, Monet's garden, the next day. Surprisingly, I realized that looking into the view finder not the screen reminded me of my first few years of me with my first camera. The viewfinder made me focus to what I see, through that small square.. and I was able to focus just that perspective outside of huge amount of crowd in the garden.
My stress amount was increasing so fast as there were more people than the flowers in the garden, and I wanted to escape as soon as possible but endured my best because this was the one reason that I came to France. I was kind of mad, or disappointed, to see many people especially asians like me- treating monet's garden for their social media exposure. Their attitude really made me wonder if they knew a slight story of Monet, and I felt embarrassed as someone from a similar country. As someone who admired his work and his theory towards his art through reading, writing, and longing, I hoped that the garden was seen as something beyond a photograph to be liked online. The shock became more obvious as I visited the museum of impressionism next door, as there were less than half the people in the garden. Even there was monet's beginning paintings of the waterlillies, but there were no people. I wondered what was that evident gap between a pretty garden and the gardener's true artwork. I stayed at the museum so long, it brought the stress down from the garden, and to be honest, the garden at the museum seemed well organized to me. Of course though, the waterlillies were only at Monet's.
모네의 정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네의 마음을 읽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어려워하는 나였지만 그래도 모든 정원을 보았다. 연꽃 호수도, 모네의 집도, 일본식 다리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정원을, 한 사람이 다 보기에 두시간 남짓 걸리는 크기의 정원을 모네가 직접 시간을 들여 물을 퍼나르고 정원사를 들여 꽃을 심고 키우고 했다는것에 새삼 놀라웠다. 단 한가지를 위한 열정, 끈기, 라고 해야하나. 그것의 결정체인 이 정원이 누군가에겐 그저 소셜 미디어용 사진의 배경이 된다는것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말이다. 나의 모네의 정원이 커지고 또 무성해지는것이 가끔 두려울 때가, 아니 자주 있다. 그렇지만 모네의 정원을 보며 다시 다짐할 수 있었다. 그가 쏟아부은 그의 정원이 그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꽃향기와 또다른 세상을 보여줄수 있다니. 그리고 그 정원은 사람은 많았지만 아름답고 또 찬란했다.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정원 자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파리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가 팡팡 터졌다. 순간 터지자마자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내 모습을 보며 아이러니 하다 생각했다. 지베르니에서 와이파이가 없을 때 그토록 힘들게 누군가에게 닿으려고 노력해하고 불안해했는데, 와이파이가 너무 잘 되니 이젠 그것을 멀리하는 청개구리같은 마음이랄까. 와이파이가 안되고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을 때 마음껏 나 스스로와 연결될걸, 좀 후회하기는 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껏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이 들어서 아쉬웠지만 돌아볼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지베르니에서 떠날 때 숙소에서 아주머니와 스콧이 배웅해주었다. 아주머니가 내게 굿럭, 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그 말을 담고 용기내어 겨우 하나 다니는 셔틀을 타고 (공짜로!) 베르논에 도착해서 파리에 잘 올 수 있었다. 나의 가는 길에 축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누군가가, 그리고 베르논의 푸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고요한 숙소의 햇살이 아직도 그립다. 정원이 비추던 무수한 연꽃들이.
기차를 타고 창문을 보며 생각했다. 지베르니는 다시 한번, 아니 최대한 많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다. 같은 숙소에 머물어도,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정원과 같은 미술관을 가도 행복할것 같았다. 그만큼 내 마음에도 지베르니같은 정원이 생긴것 같았다. 모네의 마음을 따라 와보니, 그렇게 내게도 정원이 만들어져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