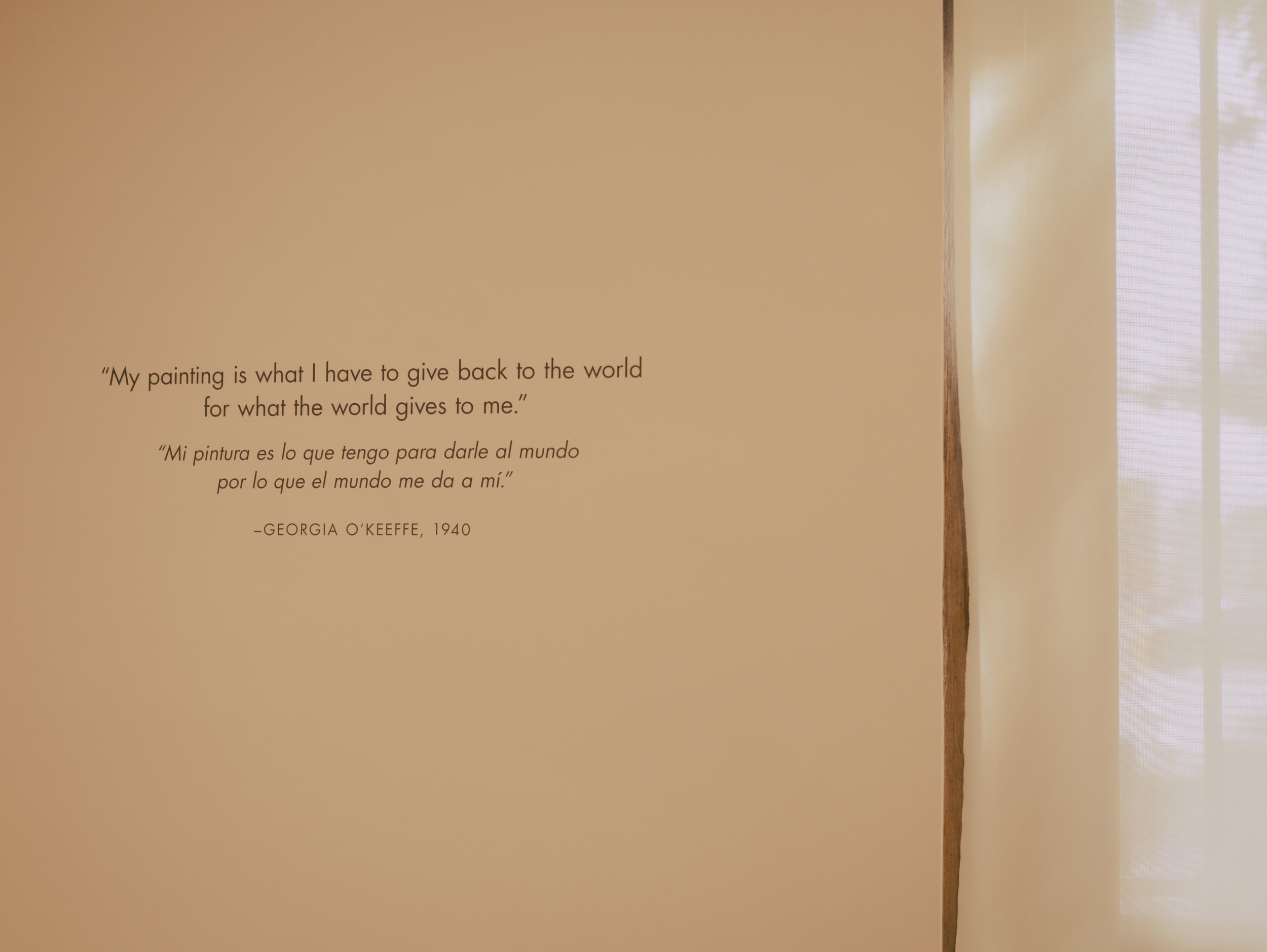Amarillo, Texas
아마릴로는 더웠다. 차 문을 열자마자 한증막 같은 여름 공기가 뜨겁게 내 입을 막았다. 그래도 그곳의 숙소는 시원하고 맑았다. 작은 공간에 모든것이 앙증맞게 들어서 있었다. 아치형으로 열린 부엌 벽에 나무 선반이 즐비해 걸려 있었고 까맣고 작은 부엌 가재 도구들이 줄지어 걸려있었다. 요즘 Tinyhome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고 숙소를 볼 때에도 직접 찾아보는데 그 작은 공간에 모든 삶의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것이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다. 마치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것 같아서 말이다. Tinyhome의 매력은 가장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도 하고 짐이 들어갈 곳을 찾아 만들어가는 것인데 나의 마음 속에도 구석구석 참 많은 공간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 구석 한 벽에 비어있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대나무색 선반을 놓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운 사람에 관한 마음, 슬퍼서 맘놓고 울지 못했던 상실에 대한 기억 같은것들 말이다. 그러나 Tinyhome의 좋은점은 많은 삶의 소유물들이 적어지고 눈에 잘 보이듯, 나도 내 마음의 공간에 자주 들어가서 먼지도 털어주고, 뭐가 있는지 속속들이 챙겨보고, 노트해보고, 그렇게 크지만은 않지만 소중한 내 공간을 가꿔나가고 싶다.
숙소 앞 3분거리에 있는 America's best thrift store에 갔다. 이름과는 다르게 가게는 신식보다는 구식에 가까웠다. 엄청난 동네의 역사가 모두 담겨있는듯이 옷과 가구, 천가지와 마네킹까지 없는것이 없어 구경하기 바빴다. 계절에 상관없이 한여름에 두꺼운 스웨터와 코트가 즐비한 옷 끝들을 만지며 구제샵의 세월 무거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낯선 동네의 옷가게를 가보면 그 동네의 체취와 역사가 어렴풋이 짐작이 간다.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취향, 취미 생활, 평균 나이대, 집의 장식품을 보는 입맛,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누군가의 시간과 세월을 작은 가게로 함축해서 본다는것. 그 낯선 동네가 조금씩 친밀해지고, 나는 또 누군가의 삶의 조각들을 내 세포 하나하나에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은 따뜻함으로 남는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내게 가장 오래 남는것은 사람의 온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나마 그 온기를, 그 마을을, 그 삶을, 내 옷장에 간직하려 구제옷을 소유한다. 오드리 햅번이 입었을만한 체크무늬 롱 원피스와 베이지 멜빵, 셔를 레이스가 크게 달린 까만 땡땡이 투피스를 샀다.
Santa Fe, New Mexico
지내본 에어비엔비 숙소중 가장 아티스틱하고, 숙소같지 않은 곳이었다. 사방이 풍경이었고, 에어컨 소리밖에 안들릴 만큼 조용한 곳이었다. 도착했을 땐 막 해지기 전의 이른 햇빛이 소파 위 큰 창문으로 밀려내려 내리쬐고 있었다. 창문은 그곳에 비춰지는 풍경으로 그림을 그렸다. 하늘이 가득 햇살을 품고 뉘엿뉘엿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각지고 붉은 색이 많은 뉴멕시코의 색깔과 어울리는 패턴과 모양이 많은 카펫과 러그가 따스히 발 끝을 감쌌다. 처음으로 이런 곳에서 사는 나를 상상할 수 있었다. 식탁 위에 놓여진 막 따온 듯한 싱싱한 주황색 꽃이 활짝 피어 우리를 환영했다.
Georgia O'Keeffe said that New Mexico is where there is nothing, and it is so far enough that nobody could come visit her. She knew the right distance between people and herself, and the boundary that she needed when she was working in her paintings. The Blue Corn Trace Artistic Barn was built by a local sculpture from here, and the place was filled with light with huge windows on two sides of four. I imagine living in a place with such distance from the city, but a close distance to the nature. Georgia knew. And I could tell the charm of this place.
오전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브런치로 호야가 해준 연어 토스트를 먹고 밝은 오후의 햇살 아래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다가, 저녁 식사 전에 자연 속에서 촬영을 했다. 연어 구이와 함께 로제파스타를 먹고 스파클링 라이메이드를 마셨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 다시 비춰오는 햇살과 함께 또 촬영을 하고, 해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양치를 했다.
자연 광경의 앞에서 낯선 지역의 세월이 묻은 옷을 입고 꽃 향기에 웃고 있는 나 스스로를 볼 때마다, 나는 사진작가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기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쁨이 몰려 올때가 있다. 매일 매일을 내가 살아가듯이, 자연도, 하늘도, 산도, 매일 그들의 하루를 살아가며 매일 다른 전경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 하루에 내가 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찬란한 기회가 나는 가슴벅찰 뿐이다. 하늘과 산, 꽃밭을, 내 방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나는 사진으로 오늘도 마음껏 담아보았다.
요즘 나의 재능과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눠졌으면 한다.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정도 말고,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색다른 꿈을, 그러한 작품을 만들수 있으면 좋을것같다. 비록 사람과 늘 함께하는것이 나에게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을것같이 느껴질 만큼 어느 공동체 안에서, 혹은 크리에이티브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싶다는 생각을 한다. 내 생각과 뜻에 침잠해 있는것도 행복하지만, 또다른 때에는 내가 가진 보물같은 재능들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것도 색다른 기쁨의 깊이가 있을것같다. 그것이 결국 롱텀으로는 내가 더 풍성하고 행복한 아티스트가 되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본다.
뉴멕시코에 오기 위해서 조지아 오키프에 관한 미술 책을 한국에서 배송 받아 읽었다. 그녀가 막 처음 뉴멕시코에 이주해서 사막에서 찍었던 흑백사진의 풍경이 이 곳에 그대로 보이는듯 했다. 차창 밖으로 휑하지만 그래서 환영하는듯한 막역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다. 파인애플같이 생긴 사막풀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조지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 30년 남짓 싼타페에서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며 살았다. 그녀는 세상이나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본인의 삶 주변 풍경과 물건, 사람들을 본인의 예술의 주 재료로 삼으며 창조했다. 그러나 그만큼 그녀는 그녀 소유가 된 고스트 랜치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환영하며 접대했다. 그녀의 집에 수많은 저명한 아티스트, 조각가, 소설가들이 방문했듯 그녀는 그녀 주위에 있던 멕시칸들, 인디언 원주민들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지냈다. 그녀는 그녀의 주변에 보이는 모든 풍경을 작품의 주 재료로 늘 그렸다. 그녀는 미국인으로서 그리는 미국 풍경과 미국 작품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만큼 외국 문물과 외국인이 대다수였던 뉴멕시코 지역의 특성도 온 팔 벌려 안았다. 그녀의 그런 올곧고, 순수하고, 그러나 투명한 아티스트 마인드가 좋아서 나는 싼타페에 와보고 싶었다.
하루 종일 조지아 오키프 생각을 했다. 그녀가 살았던 곳에 직접 발을 딛고,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 해주는 투어 가이드의 말들을 들었다. 뉴멕시코의 절경을 뒤에 두고 위치한 로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싼타페의 조지아 오키프 미술관에서 그녀의 그림들을 직접 보았다. 하루 종일 그녀의 곁에 머물러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느끼는 하루였다.
아비퀴우에 위치한 그녀의 겨울집은 7000square feet가 넘는 큰 집이었다. 그러나 침실, 부엌, 거실 등 생활 범위가 모두 한 건물이 아니라 독립된 건물들로 이루어지고 그 사이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며 풍경이 보이는 빈 구역이 반틈을 차지해 집 전체가 숫자만큼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공간 사이에 있는 쉬는 공간들이 뉴멕시코의 풍경의 조각들을 담고 있었다. 조지아는 삶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공간 사이의 빈 거리를 알고 있었던것 같다. 그 빈 공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토담벽 사이에 자연과 풀, 하늘이 가득했다. 그 사이사이의 공간들을 보며 내 하루의 작은 공간 사이에 빈 거리를 두는것이 소중하다는걸 느꼈다. 나의 작업 사이에, 관계들 사이에, 잠깐 거닐 수 있는 하늘과 나무를 두고 싶다. 조지아는 그런 삶을 위해 이런 집을 선택한것이 아닐까. 1940년대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모던한 아티스트의 삶을 추구한 여성이라니.
집에 티비를 둔 적도 없고 클래식과 재즈를 많이 들었다던 조지아의 거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오래된 바닥이 무너지는것 때문에 차창너머로 보았지만 은은한 베이지 색 벽이 비춰주는 햇살과 천장에 조지아가 직접 설치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낮의 햇살이 가득했다. Jade다육 식물이 커다랗게 창문 앞에서 조용히 우뚝 서 있었다. 조지아가 직접 디자인한 식탁 위에는 투명한 접시와 작은 테이블보가 올려져 있었다. 햇살을 받으며 식사를 했을 그림이 그려질 만큼 그 풍경이 책에서 본것만큼 흡사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거리감 때문에 더 특별히 느껴졌다. 매일 지냈을 공간의 신비로움. 뭔가 다른 그 공기가 너무나 기억에 남았다. 눅눅하지만 따뜻한듯한 사람의 온기. 내 공간에, 내 마음에 누군가 들어온다면 그런 공기가 느껴질까. 조지아만의 공기처럼, 나만의 공기가 있는 거실, 그러한 부엌을 마음에 가꾸는것을 조금씩 연습하고 싶다.
조지아의 삶, 그 공간, 작업들을 직접 내 앞에서 보고 나서 나는 사실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아티스트의 삶- 이라고 하는것이 내게 이미 있다는것을 알았다. 이미 그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듯한 내가 신기하고, 기특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내게 공간의 사이사이, 삶의 조각들의 사이사이, 하늘과 나무를 선사해주는 조지아의 마음을 내 삶에도 담고 싶다.
이 여행은 내 마음을 움직인 어떠한 아티스트를 따라 찾아나선 첫 여행이었다. 예술가에 대한 글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내가 선택하여 직접 그 사람의 삶과 장소에 머물기 위해, 그 단 한가지 이유로 떠난 나의 첫 여행이라 의미가 깊었다. 관광 명소를 찾아 다니고 맛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예약을 하는 차원의 여행보다는 내게 더 마음이 편하고 맞았다. 덜 외롭게 느껴지는 여행이라고 해야할까. 그리고 많은 용기를 얻는 동시에 마음이 돌아와서도 편안함을 느꼈다. 다음 찾아갈 반고흐와 모네의 장소 속에서 또 무엇을 만날지 기대가 되어 마음이 말랑말랑하다.